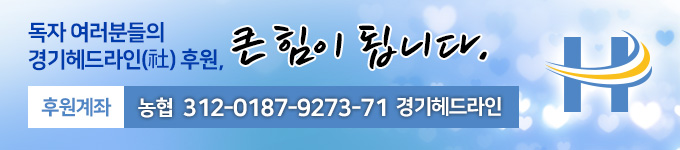[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민동요 ‘오빠생각’과 ‘고향의 봄’이 탄생한 지 100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동요의 배경에 숨겨진 사랑과 역사 이야기를 되짚어 본다.
1925년, 수원에 살던 12세 소녀 최순애는 오빠를 그리워하며 ‘오빠생각’이라는 동시를 지어 방정환이 편집하던 잡지 <어린이>에 보내 입선했다. 같은 해, 마산에 살던 16세 소년 이원수도 ‘고향의 봄’을 지어 같은 잡지에 발표했다. 이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갔고, 결국 얼굴도 모른 채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됐다.
1935년, 이원수는 수원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당시 일제의 탄압으로 감옥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른 최순애의 가족은 다른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최순애는 굳건히 이원수를 기다렸다. 결국 이원수가 석방된 후 최순애의 집을 찾아가 결혼 허락을 받았고, 1936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원수는 ‘고향의 봄’으로, 최순애는 ‘오빠생각’으로 한국 아동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오빠생각’의 주인공이자 최순애의 오빠였던 최영주는 소년운동가이자 출판인으로 활약했지만, 일제의 감시와 압박 속에 살았다. 그는 방정환과 함께 어린이 문학운동에 참여했으며, 일제 말기에는 친일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의 삶은 ‘오빠생각’의 노랫말에 깊이 새겨져 있다.
최순애와 이원수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한국 아동문학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이들의 작품은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수원의 한 소녀가 쓴 동시가 어떻게 국민동요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이다.

‘오빠생각’의 주인공 최영주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에 방정환의 무덤을 짓고, 자신의 아버지와 본인의 무덤도 그 아래에 두었다. 이는 “존경하는 선배 소파 밑에 묻어달라”는 그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이원수는 훗날 자신의 친일 행적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최순애와 이원수의 작품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음악과 문학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수원에서 시작된 이 동요와 사랑의 이야기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